기타게시판
외계생명체는 존재할까?
 2014-12-24
2014-12-24
이강환 연구관|국립과천과학관
‘외계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근거는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코스모스(Cosmos)’로 유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Carl Edward Sagan)은 ‘이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라는 말로 우주의 광활함을 요약했다.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최소 천억 개 정도가 있다.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자. 단지 숫자가 좀 크다는 것일 뿐 곱셈과 나눗셈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계산이니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1초에 하나씩 숫자를 센다면 천억을 세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당연히 답은 천억 초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되는 시간일까? 1분이 60초이고 1시간은 60분이니까 1시간은 60×60=3,600초가 된다.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3,600=86,400초이다. 다시 1년은 365일이니까 86,400×365=31,536,000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천억 초가 몇 년이 되는지 계산하면 100,000,000,000÷31,536,000=3,171년.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을 1초에 하나씩 모두 센다면 3천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다.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천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천억×천억, 1 뒤에 0이 22개나 붙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 이것은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의 수만 계산한 것이다. 태양에는 지구를 포함한 8개의 행성과 무수히 많은 작은 천체들이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런 행성의 수를 고려한다면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넓은 우주에서 특별하지 않은 은하의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하지 않은 별의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외계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다. 지질학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생명체는 지구가 만들어진 직후에 나타났다. 당시의 지구는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기 힘든 조건이었고 인간은 당연히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비슷한 환경의 다른 세계에서도 그만큼 빨리 생명체가 나타났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구에서는 이렇게 생명체가 빨리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가 지금도 존재한다. 생명체는 깊은 바다의 화산 분화구 근처의 매우 뜨거운 물속이나 남극처럼 극히 추운 곳, 그리고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지하 수 킬로미터 아래에도 존재한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특이한 생명체들은 지금 당장 화성과 같은 다른 세계로 옮겨놓아도 적어도 몇몇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외계생명체는 그냥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에 아주 흔하게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리고 초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인 화성에도 생명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많은 돈을 들여 화성의 생명체를 찾기 위해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체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든지 액체가 필요하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가 생명체 안팎으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자는 고체를 통해서는 쉽게 이동하지 않으며 기체 상태에서는 쉽게 퍼져서 흩어져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유지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액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액체가 반드시 물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 모로 볼 때 물이 가장 유리하다. 물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물 분자는 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액체들은 불가능한 화학결합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물은 다른 액체와 달리 고체 상태인 얼음보다 밀도가 높다. 얼음이 물에 뜨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의 이런 특별한 성질 덕분에 겨울에 연못이나 호수가 얼어도 그 밑에 물이 있어 생명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다른 세계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의 여부를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 지구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가 우주에서 특별한 곳이 아니라면 다른 세계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물은 지구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물질이 아니라 우주에서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주 흔한 물질이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볼 때 물을 제외하면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탄소이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DNA와 같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분자들은 모두 탄소 원자의 긴 사슬에 수소, 산소, 질소와 같은 다양한 다른 원소들이 붙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탄소는 동시에 4개까지 다른 원소들과 화학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다른 탄소 원소와 강력한 이중결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체 구성에 가장 유리한 원소가 된다.
탄소 이외에 한 번에 4개의 원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원소는 규소이다. 그 때문에 규소가 주성분인 외계생명체가 SF 영화나 소설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규소는 탄소에 비해 다른 원소와의 결합력이 너무 약하고 주로 고체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추출되지도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생명체의 탄생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더 쉬운 탄소를 두고 굳이 규소를 주성분으로 한 생명체가 등장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지구 표면에도 탄소보다 규소가 1천 배 정도나 더 많지만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모두 규소가 아니라 탄소에 기반하고 있다.
우주에 탄소는 얼마든지 있고 지구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에 기반 한 유기물질은 운석에서도 발견되고 성간물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유기물질이 어떻게 생명체로 탄생하는지는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유기물질을 가진 행성에서는 비교적 쉽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하지만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인간과 같은 지적생명체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후 지적생명체의 인류가 등장하기까지는 45억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외계생명체가 흔하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적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주는 138억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이외에도 지적생명체가 나타났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우주 어딘가에서 인류보다 먼저 등장한 지적생명체가 우리보다 먼저 우주여행을 시작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같이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외계지적생명체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생물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시력, 또는 감각기관
- 2. 물건을 쥘 수 있는 손가락 또는 촉수나 갈고리모양의 손톱이나 발톱
- 3. 언어와 같은 의사소통수단
외계생명체를 연구하는 SETI(외계지적생명체탐색) 연구소의 천문학자 세스 쇼스탁(Seth Shostak)은 위의 조건과 함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가상의 외계지적생명체인 외계인 조(Jo Alien)를 만들어냈다. 거리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눈은 두 개 이상일 것이고 최대한 멀리 보기 위해서 몸의 위쪽에 있을 것이다. 눈이 너무 많다면 뇌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두 개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마찬가지 이유로 팔과 다리 역시 너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외계인 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환경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형태의 외계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지적생명체라면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다.
SF 영화에는 우리 인간과 매우 닮은 외계인들이 흔히 등장한다. 지금까지의 추론을 보면 그것이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미는 있겠지만 별과 별 사이의 엄청난 거리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그 거리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을 알아낸 외계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도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이며, 지구의 하늘에 흔히 등장하는 UFO와 같은 유치한 수준은 절대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인류가 지구 이외의 장소에서 생명체를 만나는 곳은 아마도 화성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다.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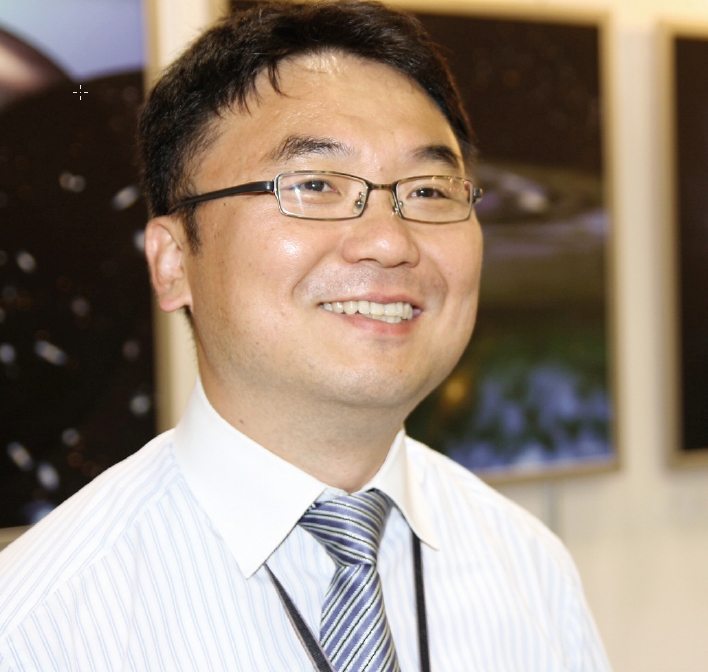 |
이강환 연구관 (국립과천과학관) |
|---|---|
|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졸업 | |
| 서울대학원 천문학 박사 | |
| 영국 켄트대학에서 로열 소사이어티 펠로우로 연구 수행 | |
| 저서 : 『우주의 끝을 찾아서』, 『미지에서 묻고 경계에서 답하다』(공저) | |
| 옮긴 책 :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 『별의별 원소들』, 『우리는 모두 외계인이다』 『우리 안의 우주』 |
- 다음
- 엉뚱한 생각으로 즐거운 세상 만들기 (1부: 창의성이란?) 2014.12.29
- 이전
- 생각하는 디자인 2014.12.24












![[우주항공청] 우주가 새롭게 보이는 우주 사전](/jnrepo/upload/cmBbs/202412/bb9f39f8532d41e18f69ecb52b900651_1734621098454.jpg)
![[과학을 채우는 시간] 별똥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우주 000?!](/jnrepo/upload/cmBbs/202412/bac84299f08247b2acb204163875b510_1734584310850.png)
![[우주항공청] 우주가 새롭게 보이는 우주 사전](/jnrepo/upload/cmBbs/202412/09909d81c8ae4c5abc53e316a528481f_17344849766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