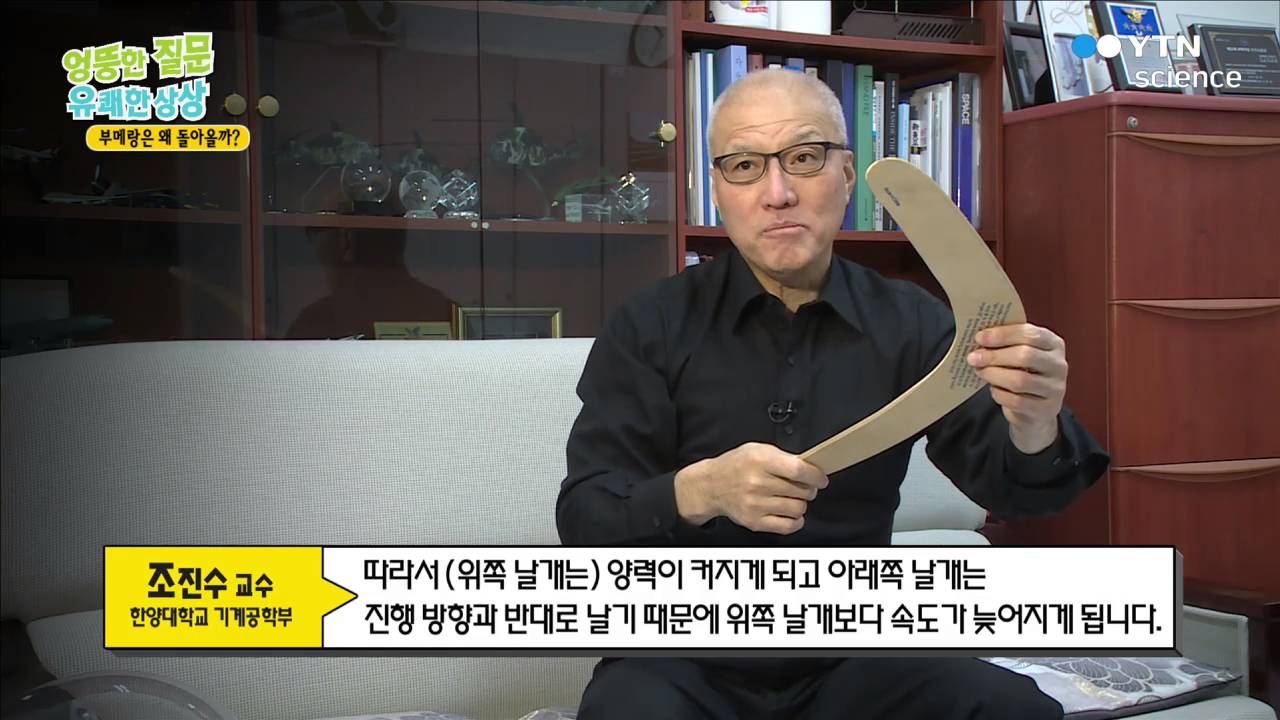부메랑처럼 생긴 규조류
 2012-03-27
2012-03-27
부메랑처럼 생긴 규조류

이 사진은 우리나라 남쪽 남해군 다랑이마을 앞바다에서 채집한 규조이다.
규조의 생김새가 꼭 부메랑이나 프로펠러처럼 생겼다. 마치 사람이 정성들여 디자인한 것처럼 정교한 기하학적 모양을 하고 있다. 자연이 만든 디자인이 이토록 정교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규조는 전 세계적으로 1만 6000종이 존재하는데, 바다에 생존하는 조류(藻類) 중에서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한다. 모양도 각양각색이어서 이렇게 부메랑 모양의 절묘한 기하학적 모양이 있는가 하면, 빗살무늬 모양도 있고, 원형, 방사형 등 다양한 모양이 있다.
대부분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규조는 규산질로 된 투명하고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다. 껍질은 윗껍질과 아랫껍질로 이루어진 상자형태를 하고 있고 그 안에 갈색의 엽록체를 가진 세포질이 들어 있다. 원시지구에서 산소를 만들어 내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다의 조류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조류 중에서도 그 수가 월등히 많은 이 규조류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다.
규조는 윗 뚜껑과 아랫 뚜껑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뚜껑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분열번식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 속껍질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열번식을 하면 할 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점점 작아져서 본래 크기의 약 60% 정도까지 작아지면, 너무 좁아 세포질이 존재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껍질을 버리고 포자를 내서 새로운 개체로 번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때, 원래 있던 껍질이 버려지게 된다.
아래 사진이 버려진 빈 껍질이다.

빈 껍질의 길이는 채 0.1 mm 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버려진 빈 껍질이 바다 아래 가라앉아 쌓이게 되고 퇴적층을 이루면, 이것이 바로 규조토가 되는 것이다. 규조토에 계속 퇴적층이 쌓여 압력이 높아지면, 규조암이 된다. 규조토는 각종 연마재나 건축자재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껍질이 쌓여 다량의 규조토가 쌓일 정도니 원시바다에 규조류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
규조는 원시지구 때부터 지금까지 생태계를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미생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글, 사진 김규환
- 다음
- 갑옷을 잎은 꽃가루, 국화꽃가루 2012.03.27
- 이전
- 열화 우라늄탄의 진실 20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