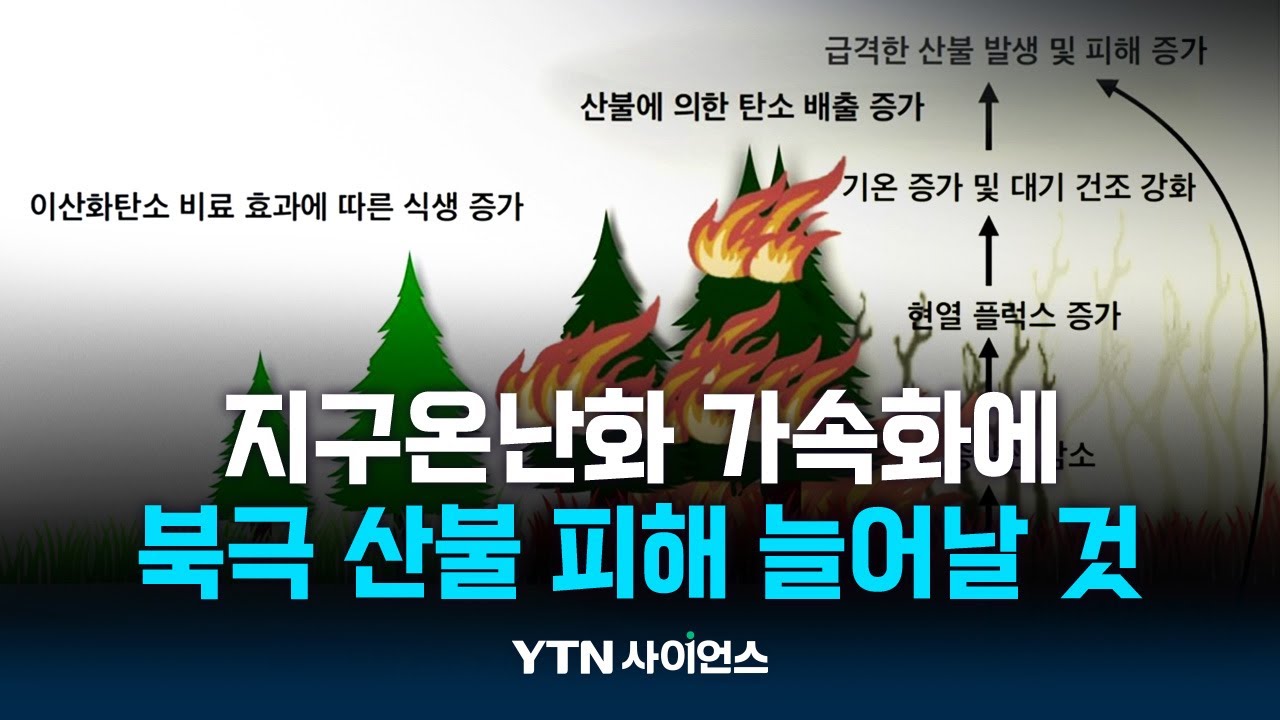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 곳곳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6-04-08
2016-04-08
21세기 바다의 시대를 준비하다 > 아라온호, 온누리호, 장보고 기지, 축 제도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 곳곳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날 육상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인류는 바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양 개발이 시작된 이래, 첨단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경제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해양자원을 연구하고 이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100여 년 정도 늦게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시작했지만, 7대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하며 전체 해양기술 수준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극지해양, 해양관측 및 예보 분야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활약하는 우리의 해양 연구시설들을 소개한다.
세계 8번째로 남북극 동시에 과학기지 운영
극지는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오염이 가장 적은 곳이다. 그러므로 대기, 해양, 지질 등 지구의 모든 환경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연구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2월 남극의 킹조지섬에 극지 연구를 위한 첫 번째 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세종과학기지는 주로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중심으로 생태계 작용과 기후, 생물의 상관관계, 극지 생명체의 저온 적응 메커니즘 등을 연구했다. 기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지역급 국제대기관측소(GAW) 역할도 해왔다.
이후 14년 만인 2002년 4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군도의 니알슨에 북극 기후와 생물을 연구하고 해양자원을 탐사하기 위한 다산과학기지가 건설됐다. 스발바르 지역은 4월부터 8월까지는 낮이 계속되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밤이 계속되는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다산기지 주변은 다양한 피오르드 해안과 북극곰, 조류, 이끼식물이 서식하는 툰드라 지역의 육지 조건을 함께 갖춰 북극의 생태계를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북극기지로서는 세계에서 12번째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남극과 북극에 과학기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세계 8번째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첫 남극기지인 세종과학기지가 건설되고 26년이 지난 2014년에는 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 만 연안에 장보고과학기지가 건설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설기지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우주기상관측동을 비롯한 16개 건물에 16명(여름에는 60명)의 월동연구대가 파견돼 근무 중이다. 세종기지는 해양환경, 연안생태 등에 관련된 연안기반 연구에 집중하고, 장보고기지는 빙하, 운석, 오존층 등에 대한 대륙기반 연구의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남극에 겨울이 찾아오면 기온이 -80℃까지 떨어지는데, 월동연구원들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추위보다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이 더 어렵다고 한다.
해외에서 연구 중인 해양과학기지는 남극의 세종기지, 장보고기지와 북극의 다산기지 외에도 페루(페루해양연구소, IMARPE)와 중국, 남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축 제도(태평양해양과학기지, KSORC)에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연구선인 온누리호,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를 건조해 전방위, 전천후 해양연구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어도, 가거초 등 한반도 주변의 해양연구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 대한 연구는 자료 수집과 연구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목적 외에 지리적 위치 및 국제적 정세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 일본, 북한처럼 해양영토 및 안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해양영토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위 관측소, 해양 관측소, 해양 관측 부이, 해수 유동 관측소, 종합 해양 과학기지로 구성된 국가 해양 관측망을 설치해 조석, 수온, 파랑, 해류, 해상 기상 등에 대한 다양한 관측 자료를 수집․분석․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연안 환경 보호, 해양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우리나라 첫 번째 종합 해양과학기지는 2003년 6월 준공된 이어도 기지이다.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과 관련된 관측과 연구, 예보에 중요한 거점이며,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등대 역할과 해난 사고 수색 전진 기지 역할도 한다. 특히 이어도 기지는 기상관측, 해양생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해양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해양 활동 영역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어도 기지는 우리 해양주권 수호를 상징하는 역할도 한다.
가거초 해양과학기지는 2009년 10월 준공됐으며 수심 15m의 수중 암반 위에 지어졌다. 규모는 이어도 기지의 1/4정도이나 과학기지로서의 기능은 크게 향상됐다고 한다. 21m 높이의 파도와 초속 40m에 이르는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기상 및 해양, 대기 환경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첨단 관측 장비가 30종 이상 설치됐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 태풍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100년 만에 한 번 올 강력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보강공사를 진행했다.
바다, 미래 자원의 보고
지구 표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지구 생물의 80%가 서식하는 공간이다. 해양 자원의 잠재가치는 연간 총 22조 6천억 달러로, 육상 생태계의 연간 총 가치(10조 6천억 달러)의 2배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광물 매장량의 이용가능 기간은 육상의 경우 40~110년에 불과하지만, 해양은 200년에서 최대 1만 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해양자원의 높은 가치와 바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엿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이라는 과제 속에서 해양 자원은 인류 생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이자 국가의 미래 이익을 담보하는 중대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닷속에 잠겨 있는 해양자원은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다음
- 예쁜 수컷, 강한 암컷 2016.04.11
- 이전
- 전기로 구리결정 키우기! 2016.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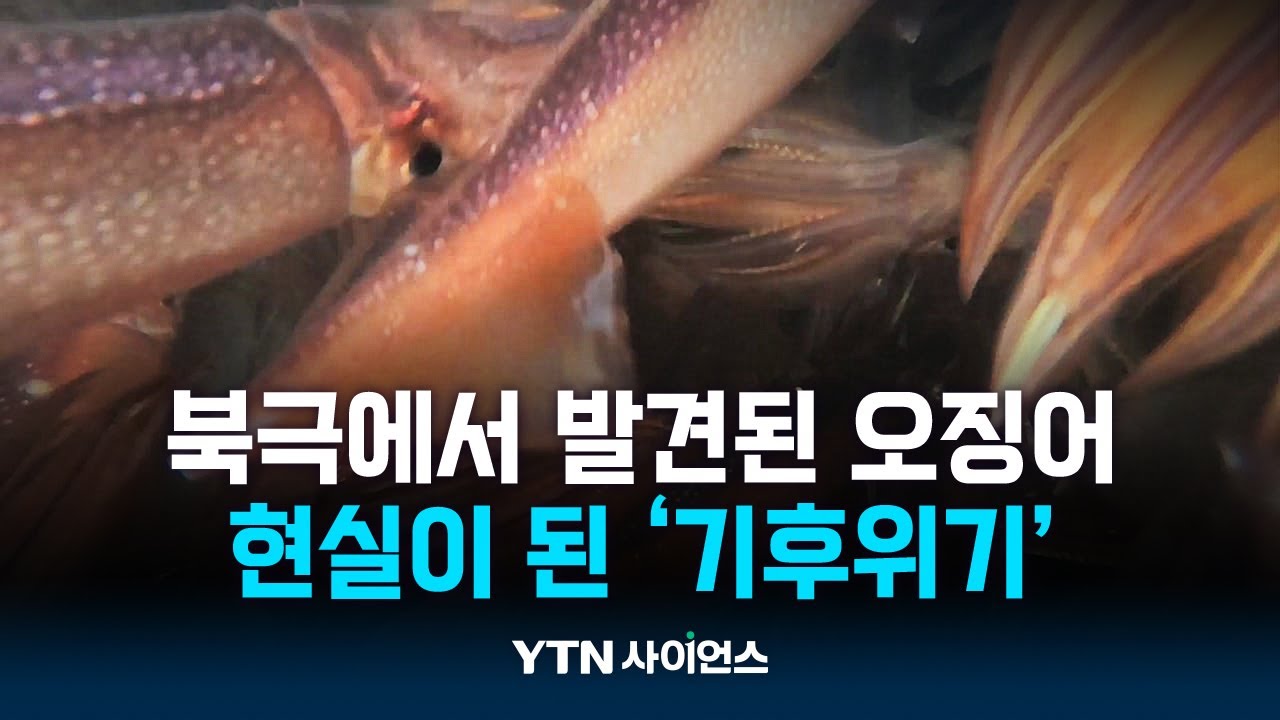
![[Pick 사이언스] “6차 대멸종” 섬뜩한 경고...인류가 바꿔놓은 충격적인 지구 상태](/jnrepo/upload/cmBbs/202410/4b83035f8401498aa85b2ea1b3b8ee57_17278719440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