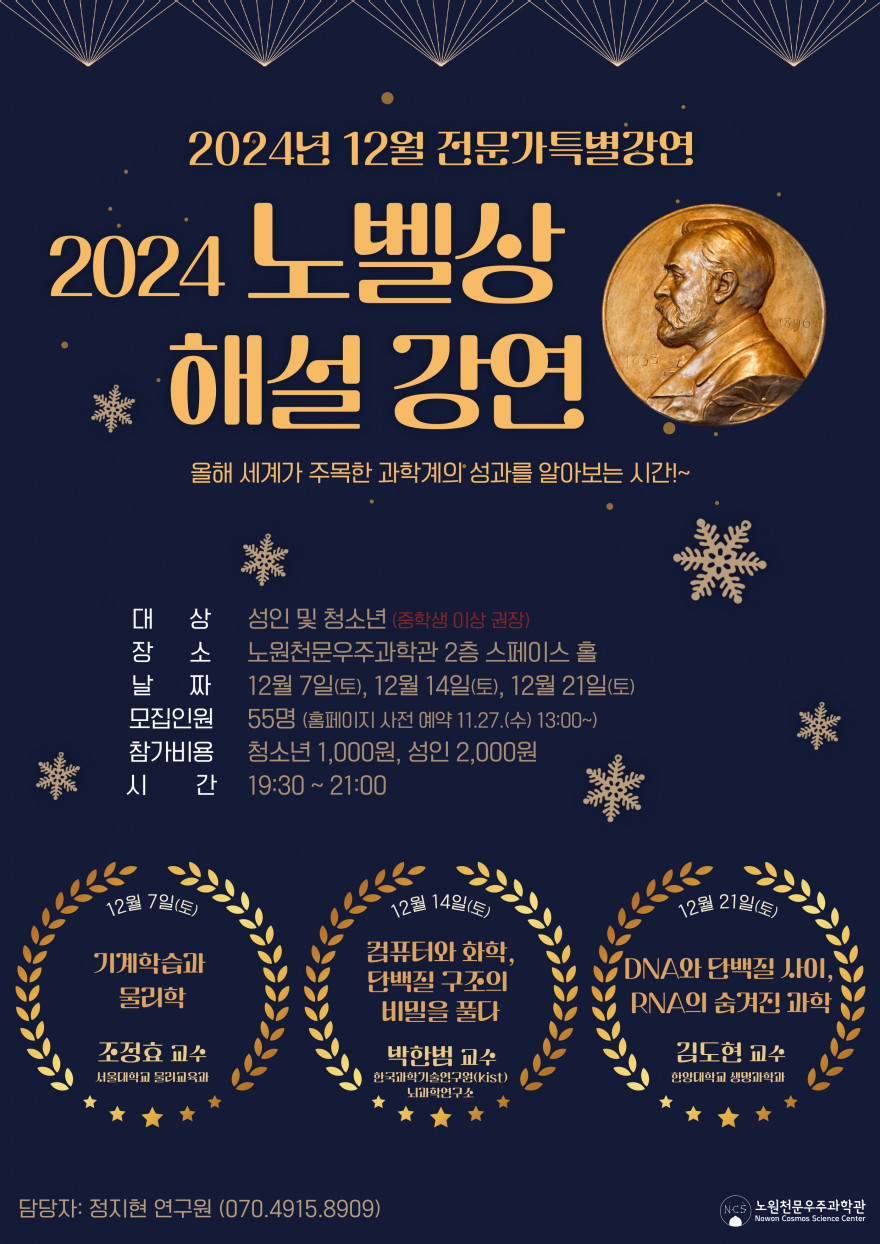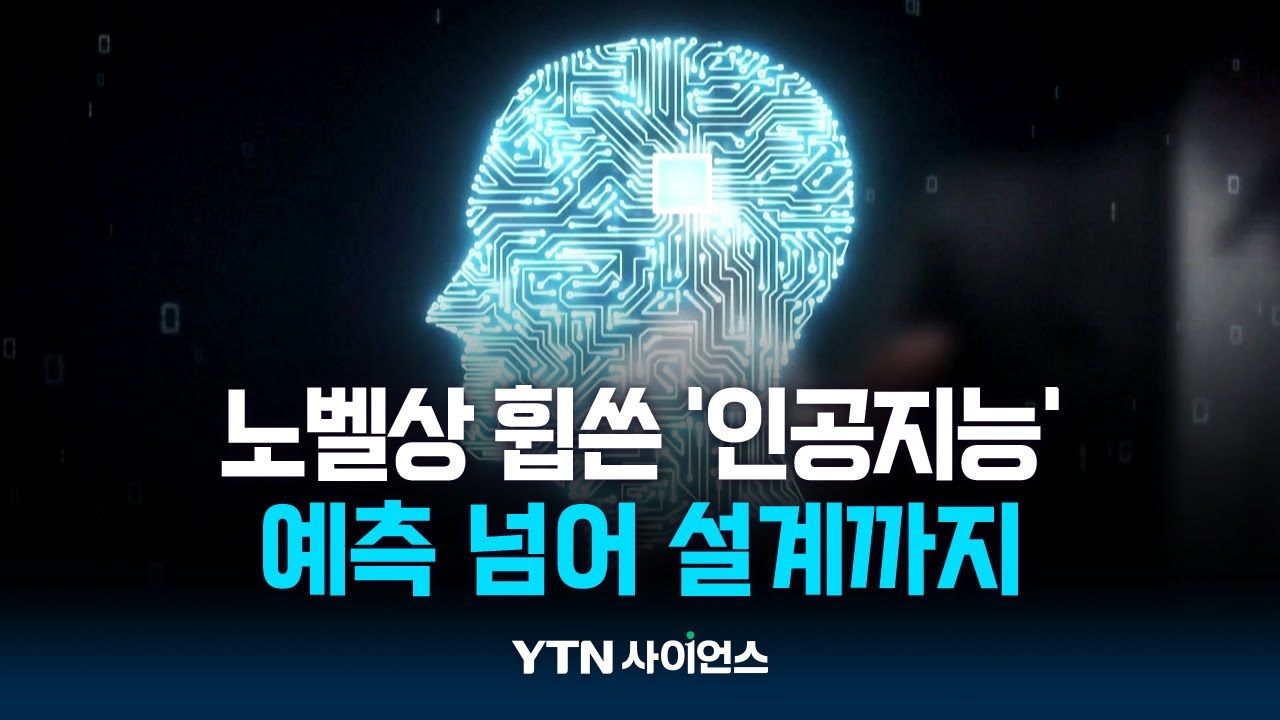[노벨상을 만나다] 2013년 노벨화학상 - 가상공간에서 분자세계를 엿보다
 2013-10-28
2013-10-28
2013년 노벨화학상
가상공간에서 분자세계를 엿보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석차옥 교수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우리는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살아서 움직이고 말하는초록색 괴물 슈렉과 피오나 공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다. 우리가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는 화학은 어떠한가? 식물이 햇볕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회복되는 등의 화학적 현상을 분자, 원자, 전자들이 주연과 조연이 되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2013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이다.
보통 애니메이션 영화는 인간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고, 등장인물이나 사물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된다. 화학이 다루는 분자 세계에서 전개되는 현상은 어떻게 묘사될까? 애니메이션에서의 한 장면은 분자 세계에서는 분자의 ‘상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분자의 상태는 분자의 구조와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분자를 등장인물이라고 하고, 분자의 구조는 등장인물이 순간적으로 취하는 포즈, 분자의 에너지는 등장인물의 마음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야기 전개에 따라 등장인물이 움직이지만, 분자의 상태는 화학 법칙에 따라 변화한다. 이렇게 분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시간에 따른 분자 상태의 변화로나타내는 것을 분자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예를 들어, 식물에서 광합성과 관계되는 단백질 분자들이 어떻게 햇볕을 받아 태양 에너지를 모으고 이것을 화학에너지로 바꾸는지 그 과정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생생히 묘사하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하자. 이것은자연이 들려주는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음미하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은 태양 에너지를 모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 전지를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자의 상태는 어떤 화학 법칙에 따라 변하는 것일까? 화학 수업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를 여러 개의 색깔 공을 연결하여 만들어진 모형으로 표현한다. 물론 각 색깔 공은 원자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물 분자는 산소 원자를 나타내는 빨간색 공 하나와 수소 원자를 나타내는 하얀색 공 두 개를 붙인 모양으로 나타낸다. 이것이 물 분자의 구조이다. 물 분자의 상태는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산소와 수소의 핵 주변에 어떻게 분포해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안정한 상태에서 물 분자의 전자들은 산소 핵 쪽에 좀 더 몰려 있고 따라서 수소 핵 쪽에는 전자가 부족하다. 따라서 산소 핵 쪽은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수소 핵 쪽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띤다. 이렇게분자를 이루는 전자의 구조와 상태는 양자 법칙으로부터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러한 계산을 가능하게 한 공로로 1998년 콘과 포플이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양자 법칙의 발견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1918년부터 1933년 사이에 5개의 노벨 물리학상이 수상되었다 (1918년 플랑크, 1922년 보어, 1929년 드브로이, 1932년 하이젠베르그, 1933년 슈뢰딩거와 디락).
위 설명으로부터 분자의 상태를 지배하는 화학 법칙은 바로 양자 법칙이라는 것을 눈치 빠른 독자는 이미 간파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양자 법칙을 적용하여 실제 분자의 상태를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계산 방법을 개발한 것 자체에 노벨 화학상이 수여되었다는 사실도 파악하였을 것이다. 양자 법칙은 고전 물리학의 법칙과 달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은 경험적인 직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어떤 공이 언덕을 넘을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은 언덕을 올라가다가 다시 굴러 내려온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서는 전자가 어떤 장벽을 넘을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전자의 일부는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다. 양자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은 전자와 같은 미시세계의 입자는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파동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분자 세계와 같은 미시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을 벗어나는, 양자 법칙이라는 희한한 물리 법칙을 적용시켜야 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한 물 분자 하나의 구조도 양자 법칙을 적용하여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관찰하는 거시세계의 물을 미시적으로 묘사하자면,앞서 묘사한 바와 같은 전자 분포를 가진 물 분자가 많이 모여 있는 상태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물 분자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모여 있고, 각각의 물 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는 물 분자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를 알면 예측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역시 양자 법칙에 따라 정해지며, 양자 화학적 계산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양자 계산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데 있다. 만약 물 분자 하나의 전자 구조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라면, 물 분자 10개가 모였을 때 전자 구조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 넘는다. 그런데 이 1시간은 10개의 물 분자들이 어떤 특정한 배치를 하고 있을 때의 계산 시간이고, 어떤 배치에서 시작하여 이들 물 분자들이 1마이크로초 동안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계산하려면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물 10개는 우리가 실제 관찰하는 물의 성질을 계산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수이다. 1000배 정도 더 큰 물 시스템에 대해 계산하려면수십, 수백만년의 계산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좀 더 복잡하고, 현실 세계에 더 가까운 분자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양자 법칙에 의거한 계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1940년대부터 많은 화학자들은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비교적 단순한 함수로 나타내어 복잡한 분자의 성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힘에는 쿨롱의 힘, 반데르발스 힘 등이 있다 (반데르발스는 19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앞서 설명한 물 분자의 경우와 같이 분자 내에는 전자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띠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각각 특정한 부분 전하를 띠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 사이에 쿨롱의 힘이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데르발스 힘은 전자의 분포가 평균적으로 균일하여 쿨롱의 힘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분자들이 가까워 지면 전자의 분포가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분자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기술한다. 이러한 쿨롱의 힘과 반데르발스 힘은 양자역학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이들을 일단 간단한 함수로 표현하면, 각 원자 또는 분자가 움직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양자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고전 역학적으로 그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게 된다. 분자 세계를 이러한 종류의 힘으로 묘사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이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전자의 분포와 상태는 일정하다는 큰 가정이깔려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예와 같이 광합성과 관련된 단백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현상을이해하려면 전자의 상태와 분포가 변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고전 역학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으로는 다룰 수가 없다. 2013년 노벨 화학상은 복잡한 분자계에서전자의 상태와 분포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부분은 양자역학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그 주변은 고전역학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다중척도 시뮬레이션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한 세 명의 과학자 카플러스, 레빗, 와셜에게 수상되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화학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복잡한 분자세계의 화학 현상을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분자들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게 되었다.
화학은 다른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실험에 기반한 학문이다. 그러나 분자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들이 밝혀지면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원리에 기반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화학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한 분자 시뮬레이션은 과학자들이 얻은 실험 결과를 정밀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분자를 설계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세 명의 과학자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기여가 숨어 있다.앞으로 화학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독자들이 활동하게 될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종류의 일에 노벨상이주어지게 될까?
- 다음
- 2013 노벨상을 만나다 2013.10.28
- 이전
- [노벨상을 만나다] 2013 노벨물리학상 이해하기. 힉스입자는 무엇인가? 2013.10.28












![[과학향기 Story] 난자와 정자 결합의 또 다른 비밀, 알파폴드가 풀다](/jnrepo/upload/cmBbs/202412/6c353f3b9aa94a0ba3c1b1e673132d6f_173345076242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