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생명분야 20세기이후 10대 사건 8]
DNA를 수백만 배 증폭하는 PCR 기술
영화 ‘쥬라기공원’을 보면 공룡을 복원하기 위해 호박 화석에 담긴 모기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온다. 모기가 공룡의 피를 빤 채로 갑자기 화석이 되면 모기의 소화관에는 공룡의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림 1 영화 ‘쥬라기공원’에서 공룡의 DNA를 증폭시키기 위해 PCR 기술을 쓴다. 사진 제공 : 동아일보 |
이 공룡의 피에서 DNA를 추출해 공룡을 복원한다는 아이디어다. 이때 DNA의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수백만 배로 증폭할 필요가 있다. 이때 등장하는 기술이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다. 물론 영화 속 장면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니 오해하지 말자.
PCR을 고안한 캐리 멀리스는 1993년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재미있게도 1993년은 서두에서 밝힌 영화 ‘쥬라기공원’이 개봉한 해다. 현재 이 방법은 생명과학은 물론 고고학, 법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이 방법이 사라진다면 컴퓨터가 사라진 것만큼이나 분자생물학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만큼 유용성과 파급효과가 엄청난 생명과학 기술 중 하나다.
유전자 연구가 어려운 이유

그림 2 PCR을 고안한 캐리 멀리스. 여자를 좋아하고, 연구보다 윈드서핑을 즐기는 등 괴짜 행보로 유명하다. 사진 제공 : 동아일보 |
전자를 연구하려면 원하는 특정 유전자의 DNA를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유전자를 골라내는 일은 만만치 않다. 사람의 유전체는 약 30억 쌍의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특정 유전자는 기껏해야 수천~수십만 개의 DNA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65억 명의 지구인 중 특정인 한 명을 찾는 셈이다.
숫자가 많다보니 양이 적은 것도 문제다. 숙련된 생물학자는 인체 조직 1g에서 1㎎의 DNA를 얻을 수 있다. 1㎎의 DNA 덩어리 내에는 30억 개의 DNA가 여러 쌍 존재한다. 만약 어떤 과학자가 300개의 DNA로 구성된 유전자를 얻고 싶다면, 분리한 1㎎의 DNA 속에는 원하는 DNA는 100만분의 1밖에 들어 있지 않은 셈이다. 원하는 DNA를 찾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어렵게 찾았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적다는 점은 유전자 연구에 큰 난제였다.
멀리스는 유전체로부터 필요로 하는 작은 DNA만을 분리해 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우니, 반대로 전체 유전체 중에서 내가 원하는 DNA 부분만을 증폭시켜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역발상으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려면 DNA를 합성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DNA를 만드는 DNA 중합효소
먼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DNA 합성을 이해해야 한다. 생물에서 DNA 합성은 세포가 분열할 때 일어난다.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염색체는 두 배로 늘어나는데, 바로 염색체 구성물질인 DNA가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생물학자 아서 콘버그는 하나의 DNA 덩어리가 두 개로 복제되는 메커니즘을 연구했다. 인체가 성장하며 몸이 커지는 과정에서 DNA 복제와 세포분열은 수시로 일어나며, DNA가 복제될 때의 반응온도는 인체온도와 같은 37℃가 가장 적당하고, 이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는 인체 내에 존재하는 DNA 중합효소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공로로 그는 1959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는 DNA 중합효소 외에 DNA의 재료로 사용되는 dNTP, 효소의 기능이 잘 되도록 돕는 마그네슘 이온(Mg2+), 어디서부터 복제를 시작할 지를 결정하는 시발체(primer) 등이 필요하다.
DNA 복제 기전을 지퍼에 비유하자면, 지퍼 한 줄에 반대편 지퍼의 조각들이 차례로 붙어 반대편 지퍼를 완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처음 붙는 지퍼 조각’(시발체)의 위치에 따라 반대편 지퍼의 길이가 결정된다.

그림 3 원래 두 가닥인 DNA는 복제될 때 단일 가닥으로 풀린다. 단일 가닥의 염기에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들이 달라붙고, DNA 중합효소가 이들을 연결해 반대편 가닥을 만든다. |
2제곱으로 늘어나는 PCR의 원리
멀리스 이전에도 콘버그가 밝힌 메커니즘을 응용해 원하는 DNA 조각을 얻는 방법을 연구한 과학자가 있었다. 단백질 합성 과정에 이용되는 유전암호를 해독한 공로로 196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코라나가 그 주인공이다.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코라나는 결국 실험 방법을 완성하지 못했다.
멀리스는 다른 재료는 DNA 복제 과정과 똑같이 사용하고, 시발체만 증폭시키고 싶은 DNA 염기서열 앞·뒷부분에 결합시키면 원하는 DNA를 많이 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중나선으로 결합된 DNA에 열을 가해 한 줄씩 풀어준 뒤 시발체를 넣고 온도를 낮춰 DNA 한 가닥과 시발체가 붙게 했다. 여기에 DNA 중합효소를 넣으면 시발체로부터 DNA 조각이 붙기 시작해 이중나선 DNA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DNA가 제곱수로 복제된다. 10번 반복하면 DNA 가닥 수는 1024(210)개, 20번 반복하면 100만(220)개, 30번 반복하면 10억(230)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연구에 쓰기에 충분한 양이다. 멀리스는 이 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안해 1985년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림 4 90℃ 이상이 되면 DNA가 단일 가닥으로 풀린다. 여기에 시발체와 DNA 중합효소를 넣으면 DNA가 합성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DNA를 수백만 배로 증폭할 수 있다. |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멀리스가 고안한 방법으로 DNA를 복제하려면 반응 온도를 90℃ 이상 올려야 하는데, 이 온도에서는 DNA 중합효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70℃ 이상이 되면 그 성질이 변화하여 고유 기능을 잃게 된다. 따라서 한번 합성할 때마다 온도를 90℃로 높였다가 37℃로 낮춘 뒤 DNA 중합효소를 넣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게다가 37℃로 낮추면 기껏 한 가닥으로 분리된 DNA가 서로 붙어버리는 현상이 생겼다. 멀리스가 고안한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
온천에 사는 세균, 해결사로 등장

그림 5 뜨거운 온천에 사는 세균 Thermus aquaticus. 이 세균에서 찾은 Taq DNA 중합효소 덕분에 PCR 기술이 완성됐다. 사진 제공 : Diane Montpetit. |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일본인 미생물학자 사이키였다. 사이키는 온천에서 생존하는 세균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온천물에서도 생존하는 세균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 세균에 DNA 중합효소가 있다면 멀리스가 고안한 PCR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온천에 사는 세균의 단백질 중에서 DNA를 합성하는 단백질을 분리해냈다. 즉 높은 온도에서도 기능을 잘 발휘하는 DNA 중합효소를 찾은 것이다. 그것은 온천에서 살고 있다는 뜻으로 테르무스 아쿠아티쿠스(Thermus aquaticus)라 불리는 Taq DNA 중합효소였다. Taq DNA 중합효소의 최초 보고는 1969년 미국의 미생물학자 토머스 브록에 의해서였지만, Taq DNA 중합효소를 이용해 PCR 기술을 완성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멀리스가 고안한 PCR에 Taq DNA 중합효소를 쓰자 끓는 물에서 아무 문제 없이 DNA를 합성할 수 있었다. 높은 온도에서도 파괴되지 않으니 DNA 중합효소를 계속 넣어주지 않아도 되고, 두 가닥으로 분리된 DNA가 다시 붙어버리는 문제도 해결됐다.
이 연구결과는 곧 세계에 알려졌다. 사이키가 분리한 Taq DNA polymerase는 특허 취득 후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아주 미량의 DNA를 원하는 만큼 무한정 증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의 가치는 대단했다. 분자생물학 연구를 하는 실험실은 물론, 법의학, 고고학 등 DNA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실에서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PCR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활용 가치가 거의 무한하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에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하나만 있으면 PCR로 수백만 배 증폭해 범인 검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원확인, 친자감별, 인류의 조상 추적 등 그 활용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게다가 과학자들은 PCR의 기본 개념에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추가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PCR이 어디까지 응용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교육팁]
신문지 한 장을 준비한다. 먼저 학생들에게 만약 신문지를 40번 접으면 그 두께가 얼마일지 추측하도록 한다.
다음 직접 신문지를 접도록 시킨다. 실습을 통해 몇 번까지 접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최대로 접은 두께를 실제로 측정한 뒤 40번을 접는다면 그 두께가 어떻게 될지 계산하자. 만약 신문지의 두께가 0.2mm라면 40번 접었을 때의 두께는 0.2×240mm = 220,000km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382,000km)에 육박한다.
PCR은 DNA를 2의 제곱수로 증폭시킨다. 반복 회수가 늘어날수록 DNA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교육 과정]
- 초등학교 5학년 우리의 몸
- 고등학교 1학년 유전과 진화 |
글 / 예병일 연세대 원주의과대 교수ㆍbiyeh@naver.com |
 2010-07-05
2010-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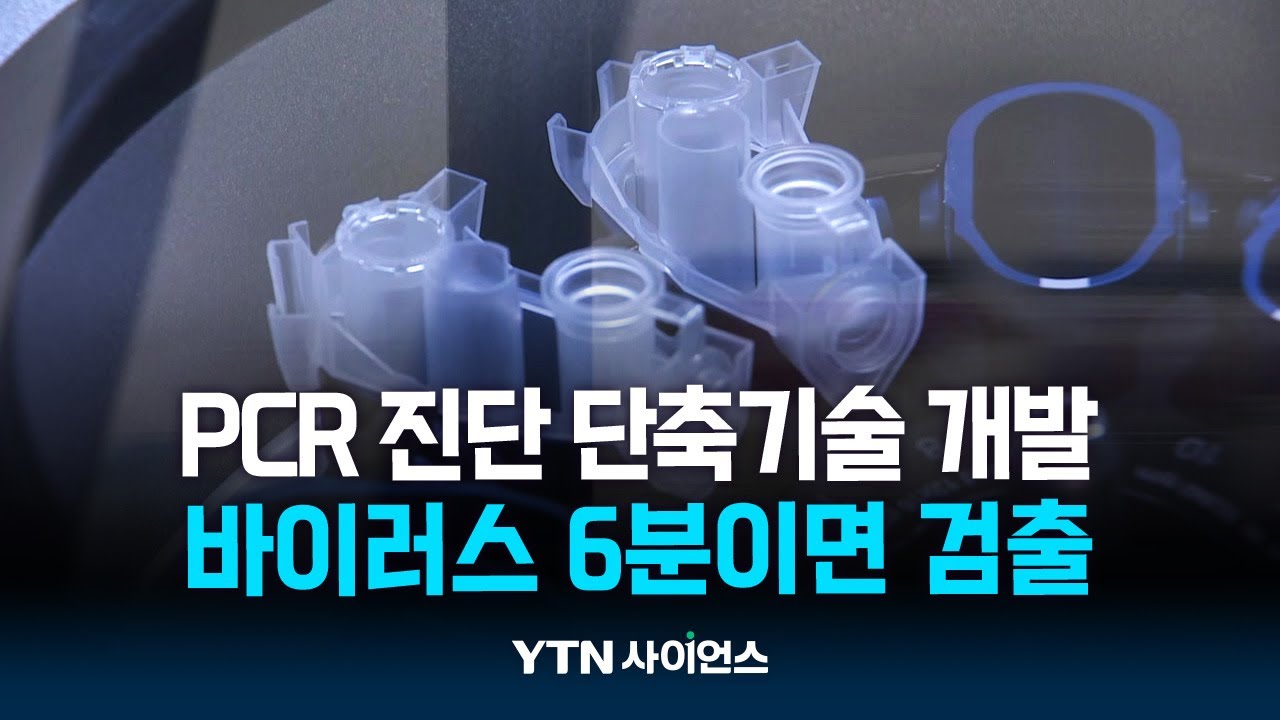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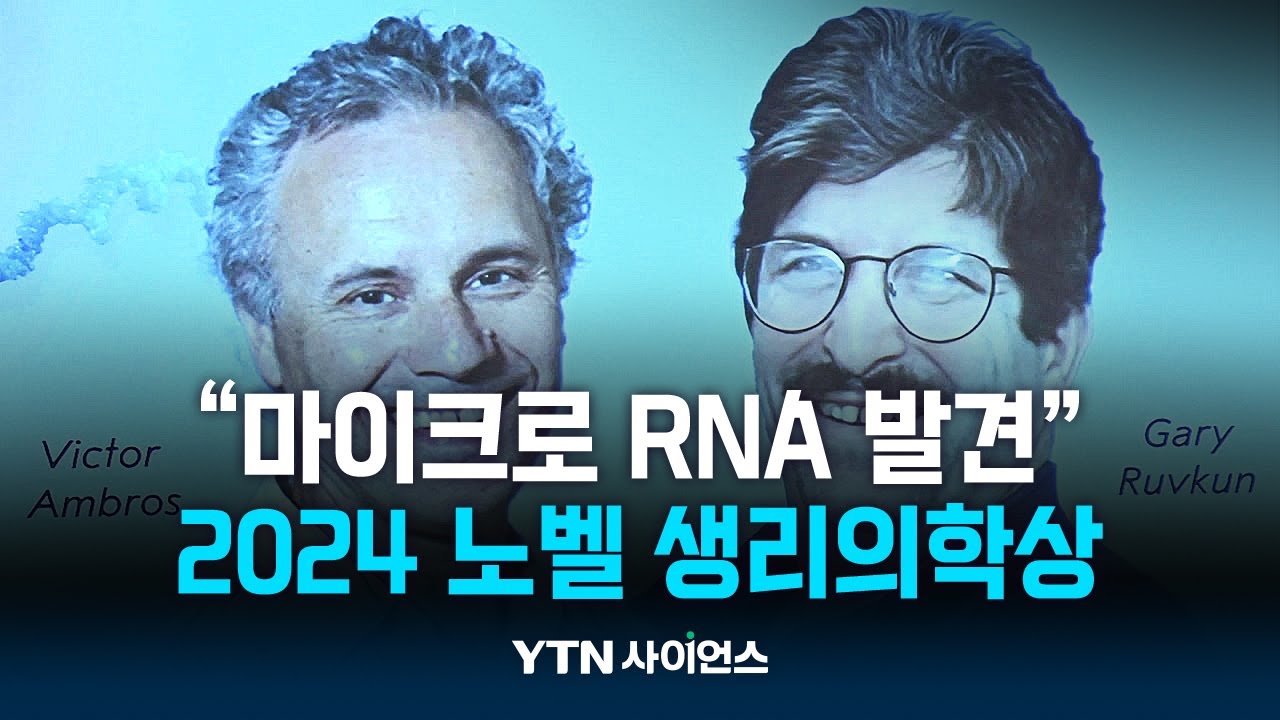
![[사이언스포럼] 너와 나의 연결고리 DNA](/jnrepo/upload/cmBbs/202408/4fb657cf3fef41c58e63db8ab8949aeb_17243253686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