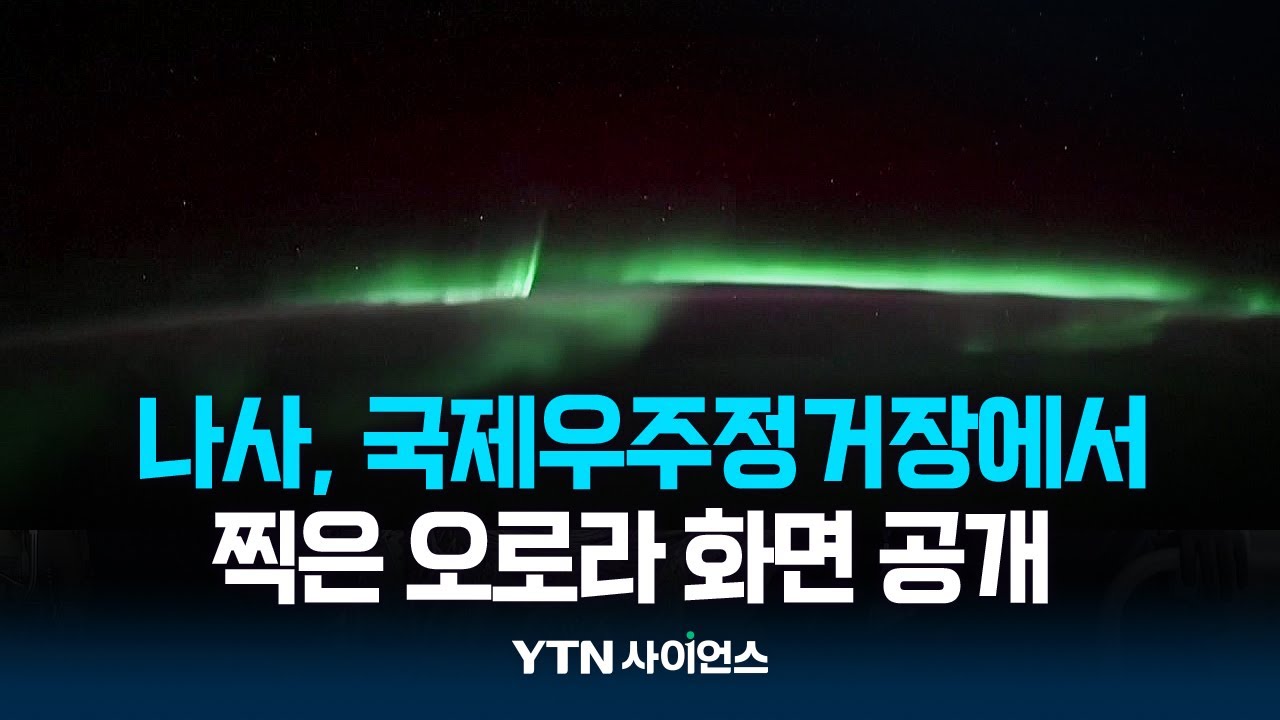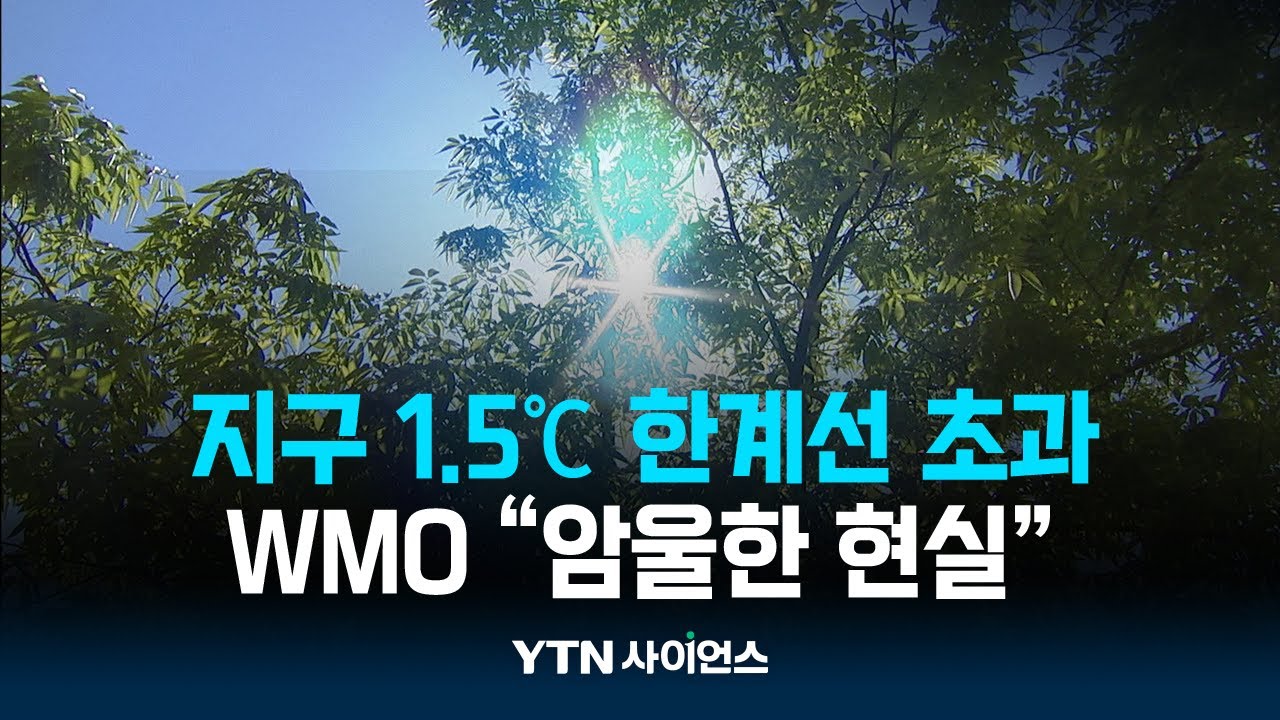판구조론, 지구의 비밀을 밝혀내다
 2010-06-24
2010-06-24
|
[환경해양에너지분야 20세기 이후 10대 사건 3] 판구조론, 지구의 비밀을 밝혀내다
판구조론(Plate Tectonics)이란 지질학적으로 큰 널빤지 모양의 암석덩어리를 가리키는 판(plate)이란 단어와 건설하다(to build)라는 어원의 희랍어 단어인 지구조(tectonics)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판구조론은 '암석권(lithosphere)라 흔히 불리는 약 100km 정도 두께의 지구 표면이 10여 개의 판(plates)으로 쪼개져 있으며, 이 판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판구조론은 지구내부가 ‘단단한 고체’로만 되어있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에게 지구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는 인류에게 지구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했으며, 대륙이동설, 지진발생 이유, 해저확장설을 증명하며 20세기 이후 지구 환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오늘날 화산폭발, 지진, 쯔나미 등 중요한 지질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신문지상에 판구조론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대륙이동설의 등장
1527년경 만들어진 세계지도를 보면 북?남미 동쪽 연안 해안선과 유럽 및 아프리카의 해안선을 함께 짜 맞춰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유사한 모양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들 대륙이 붙어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의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생물지리학을 발전시킨 독일의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가 단순히 대륙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차원을 넘어 생물학, 지질학, 지리학 등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과학적인 수준의 논의로 이끌어낸 사람은 독일의 기상학자 베게너(Alfred Wegener, 1880-1930)이다.
게다가 과거 일부 대륙에 극적인 기후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있었다. 남극 대륙에서 석탄 형태로 발견된 열대식물 화석은 지금의 남극 대륙이 과거에는 적도에 가까운 위치였음을 말해주는 증거고, 오늘날 사막지역인 아프리카에서 빙하시절 흔적을 보이는 퇴적물이나 오늘날 극지방에서만 발견되는 고사리류 화석이 발견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당시 지질학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주장이었다. 베게너는 거대한 대륙덩어리를 그렇게 멀리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지진학자들의 강력한 반대로 대륙이동설은 묻히고 말았으며, 베게너는 자신의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데 일생을 바치다가 1930년 그린란드 탐사를 떠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동사한 채로 발견됐다.
하지만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양학자들이 바다를 연구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는다.
바다 밑에서 무슨 일이? 사람들이 평균 3800m 깊이의 바닷물 속에 감춰져있던 해저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1960년대에 와서의 일이다. 해저의 모습을 파악하려면 바다 여러 곳의 수심을 알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다가 확장되고 있다 '해저확장설' 1950년대에 해저암석의 자기장에 관한 연구가 새로 시작됐다. 탐사에 이용된 자력계(magnetometer)는 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를 개조한 것이다. 이 장비를 이용해 해양조사를 할 때면 의례히 자기장이 측정되었는데, 특히 해저산맥 주위에서 이상한 모습이 관찰됐다. 해저는 마치 얼룩말의 줄무늬 모양을 보였다. 이 무늬는 해저산맥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정상자기(normal polarity)를 가진 암석과 역전자기(reversed polarity)를 가진 암석이 서로 반복되어 줄무늬의 띠 모양으로 정렬돼 있었다.
“대륙이 갈라지면서 생긴 해저산맥의 밑에서부터 용암이 솟아올라 식으면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진다. 이 암석들은 만들어질 당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약한 자성을 지니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지구의 자기가 바뀌면 이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해양지각은 반대방향의 자성을 가진다. 바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해양지각의 얼룩말 줄무늬를 만드는 것이다.” 1963년 바인과 매튜스는 이러한 주장으로 해저의 줄무늬 모양을 설명했다. 당시 이 주장은 별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1966년 바인이 해저의 자기성질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와 실측치가 일치함을 보인 논문을 발표하면서 해저확장설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0년대 초 헤스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 이로서 판구조론의 확립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움직이는 것은 판이다, 판구조론의 확립 지진이 만들어내는 지진파가 지구 내부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하던 지구물리학자들은 지각과 최상부 맨틀을 포함하는 약 100km 두께의 암석권(lithosphere)은 매우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그 밑에는 연약권(asthenosphere)이라 불리는 힘을 받으면 ‘움직일 수 있는’ 층이 있음을 알게 됐다. 지구내부가 ‘단단한 고체’로 되어있다고 믿으며 베게너의 생각에 그렇게 강한 반대를 하던 이들이 지구내부에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이 있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리면서 베게너를 괴롭혔던 대륙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런 사실들이 종합되면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 지구의 약 100km 두께의 표층(암석권, lithosphere)은 해저산맥, 해구 등을 경계로 하는 10여 개의 조각 (판, Plate)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대적인 운동을 한다.
암석들은 해저산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암석에 밀려나면서 식어 단단해진다. 이렇게 차례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저산맥에서 멀어지면서 수심도 점점 깊어진다.
1970년대 잠수정이 등장하면서 과학자들은 해저산맥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 눈앞의 해저산맥은 지구내부에서 올라온 뜨거운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베개모양 현무암이었다. 이에 더해 70년대 후반에는 깊은 바다 속에 섭씨 350도에 이르는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해저온천이 발견되면서 판구조론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됐다.
[교육팁] 판구조론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거대한 대륙들이 처음에는 한 데 모여 있었다니 신기하죠? 자 그럼 지도를 보면서 판구조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세요.
● 주제1: 판구조론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해 서로 각자의 의견을 나눠본다. (주제를 확장해 각자 어떠한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발표하는 것도 좋음)
● 주제2: 판이 이동할 수 있었던 근거인 지구내부 구조를 살펴보고 대륙이 갈라지는 과정을 되짚어본다.
[교육 과정] - 초등학교 4학년 과학, 화산과 지진 - 중학교 1학년 과학, 지각변동과 판 구조론 - 중학교 2학년 과학,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글 / 김경렬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krkim@snu.ac.kr |
- 다음
- 23개의 문제를 풀어라,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알게 될 것이다 2010.06.24
- 이전
- 강철보다 강하고 비단보다 아름다운 나일론 2010.06.24
관련 콘텐츠
댓글 남기기
전체 댓글수 0


















![[Pick 사이언스] “6차 대멸종” 섬뜩한 경고...인류가 바꿔놓은 충격적인 지구 상태](/jnrepo/upload/cmBbs/202410/4b83035f8401498aa85b2ea1b3b8ee57_17278719440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