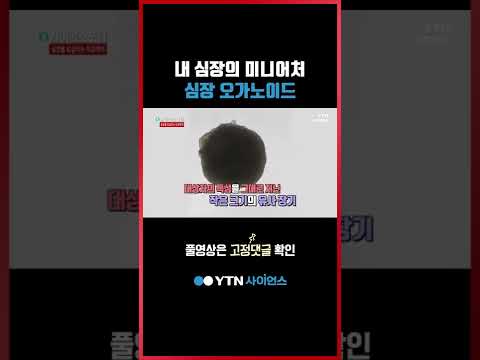[기초과학분야 20세기 이후 10대 사건 9]
보이지 않는 빛 엑스선, 21세기 첨단 기술 발전 가져와

19세기 말 과학계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엑스선의 발견이다. 엑스선은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Wilhelm Conrad Rontgen, 1845~1923)이 크룩스 진공관을 이용해 기체의 방전현상을 연구하다가 처음으로 발견했다. 엑스선이라는 이름은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빛이라 생각하고 뢴트겐이 붙인 이름이다. 때문에 엑스선은 뢴트겐선이라고도 불린다. 뢴트겐은 이 발견으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크룩스 진공관(Crooks tube)
기체분광 연구에 사용하는 진공방전관의 일종.
기체 방전 현상
기체는 보통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중성이지만 강한 정기장 속에 있을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 중성분자가 이온화돼 전류가 흐르는 현상.
필라멘트
전구·전자관 속에 있는 가는 금속선. 전류를 흘려주면 빛과 열을 방출. | |
이 후 20세기에 들어서며 점차 발전한 엑스선은 의학분야, 산업분야 등에 널리 활용되며 인류 기술 문명의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된다.
알 수 없는 빛, 엑스선의 발견
엑스선은 수 피코미터(picometer, 1 pm = 10-12meter)에서 수백 나노미터(nanometer, 1 nm = 10-9meter)의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이것은 엑스선이 원자의 크기에서 머리카락 두께 정도의 파장을 가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물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물체가 빛을 발하거나 빛을 반사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인데, 이 빛 역시 전자기파이다.
|

그림 1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사진 제공 : 위키피디아 |
엑스선은 사람이 직접 볼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아지는 순으로 전파·적외선·가시광선·자외선·엑스선·감마선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투과적인 성질이 나타나며,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고 반사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이러한 엑스선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발생장치가 필요하다. 1913년 쿨리지(William David Coolidge, 1873~1975)는 크룩스 진공관의 음극을 뜨거운 필라멘트로 교체해 엑스선 발생량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개량한 엑스선관을 선보였으며, 이 엑스선관은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물질의 내부를 꿰뚫어보는 엑스선
엑스선 파장은 자외선보다는 짧고 감마선보다는 길다. 엑스선이나 감마선 등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아 물질 내부 깊숙이 투과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엑스선을 이용하면 마치 마술처럼 물질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엑스선은 직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름이나 검출기를 이용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엑스선 검출기는 엑스선이 물질을 전리시키는 성질을 이용해 만든다.

그림 2 엑스선을 처음으로 발견한 뢴트겐(왼쪽)과 엑스선으로 촬영한 뢴트겐 부인의 손. 사진 제공 : 동아일보 |
여기서 전리현상(ionization)이란 중성을 띄는 원자에서 전자를 이탈시켜 원자와 전자가 전기를 띄는 양이온(positive ion)과 자유전자(free ele는 평판형 검출기(flat panel detector), 즉 DR(digital radiography)이 개발됐다. 이 DR은 필름 현상 ctron)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엑스선, 의학 분야에 가장 큰 공헌
엑스선의 가장 중요한 활용 분야는 의료 진단분야다. 엑스선은 1953년 초음파나 1973년 자기공명영상기술이 도입되기 전까지 인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전자공학이 출현하고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엑스선은 단순한 촬영만이 아닌, 컴퓨터단층촬영(CT(Computed Tomography), 1970년대~), 투시조영촬영(fluoroscopy, 1950년대~), 디지털영상합성(digital tomosynthesis) 등 다양한 방법에 이용되고 있다.
단순촬영은 엑스선과 엑스선용 필름을 이용해 가슴, 배, 골격 등 인체의 일부를 촬영하는 가장 간단한 검사법이다. 이 검사법은 결핵, 폐렴, 폐암, 신장결석, 골절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엑스선용 필름은 현상할 때 유독물질을 사용해야 하며 현상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비정질 실리콘을 기반으로 하없이 촬영 후 바로 컴퓨터 모니터에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한 다양한 보존 진단(CAD, computer aided diagnostics)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3 의학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엑스선. CT(왼쪽) 촬영 모습과 엑스레이로 촬영된 뇌 사진(오른쪽). 사진 제공 : 동아일보/SXC |
‘CT’로 많이 알려져 있는 컴퓨터단층촬영은 1972년 발명된 장비로, 이후 컴퓨터 및 반도체, 재료의 발전과 함께 계속 발전해 왔다. 컴퓨터단층촬영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원통형 구멍이 있는 장치에 사람이 누우면 원통외부에서 엑스선관과 검출기가 동시에 360도 회전하면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게 된다. 이 데이터를 영상재구성 기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풀어내면, 인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절단한 것과 같은 단면영상을 볼 수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단순촬영의 단점인 장기들이 겹쳐 보이는 현상을 없앨 수 있다. 따라서 호흡기, 소화기, 두경부(머리와 목), 근골격계 질환의 정밀진단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촬영 속도가 빨라져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심장질환을 동영상으로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컴퓨터단층촬영이 촬영대상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모든 방향에서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면, 디지털영상합성법은 촬영 대상의 구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상의 외부 한 점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거나 일부만 회전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방법은 특정한 부분을 깊이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 방법은 유방암, 치과 진료 등에 한정돼 활용되고 있다.
투시조영촬영은 말 그대로 인체내부를 영화처럼 보여주는 촬영 기술이다. 식도, 위, 십이지장 등의 소화기관과 간, 신장, 방광 등의 기관을 선택적으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조제된 조영제를 복용 또는 혈관에 주입한 후 방사선 투시 장치를 이용해 검사한다.
이밖에 엑스선을 인체에 직접 쏘임으로써 특정 질환이나 각종 암 치료 등 진단 이외의 의료 분야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주사기나 수술용 장갑 등 의료용구의 소독에도 사용하고 있다.
산업·공학·순수과학... 엑스선의 다양한 응용
엑스선은 의학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다. 에너지가 낮은 엑스선은 엑스선의 반사성을 이용해 단백질 등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에너지가 높은 엑스선은 엑스선의 투과성을 이용해 인체의 내부를 촬영하거나 용접 부위의 결함을 검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림 4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이 수하물 검색 장치(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동아일보 | 의료진단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엑스선은 해외여행을 할 때 공항에서 볼 수 있는 수하물 검색 장치이다. 여기서 엑스선은 수하물의 내부를 투시해 값비싼 귀금속이나 마약, 총기류와 같은 불법 물품의 밀반입을 막으며, 위험물질이나 무기 등을 검색해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사용된다.
수하물 검색 장치는 많은 양의 물품을 신속하게 검사해야 하므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품을 이동시키면서 엑스선으로 촬영해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는 선형어레이검출기(linear array detector)를 사용해 엑스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컴퓨터로 처리한 후 검사요원의 모니터에 투시 영상을 제공한다.
한편, 항공은 물론 항만에서도 엑스선을 사용한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항구는 선형전자가속기를 이용한 고에너지 엑스선 검색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운송 트럭에 실린 채로 수출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검사한다. 예전에는 모든 검사를 사람들이 직접 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컨테이너 검색에 엑스선을 사용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수백 배 절감됐다.
엑스선의 또 다른 주요 응용 분야는 산업적 비파괴검사 분야다. 건축물의 철골구조나 파이프, 유조선과 같은 대형 구조물의 용접부위를 검사할 때 엑스선을 사용한다. 또한 항공기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의 검사, 건전지나 미세 공산품의 구조적 결함이나 온라인 불량품 검사, 포장 식품류의 불순 이물질 검사 등에도 엑스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 검색이나 비파괴 검사 분야 역시 의료진단과 마찬가지로 단순촬영 외에도 단층촬영, 영상합성법 등과 같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도와 검사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엑스선은 생명공학이나 식품공학분야에도 이용되는데, 식품의 멸균이나 동식물의 품종개량, 암 치료, 새로운 기능성 물질의 생산에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엑스선은 전리현상을 가지고 있어, 많은 양의 엑스선을 유기물에 쏘이면 단백질이나 DNA의 구조를 바꿔 새로운 화초나 곡물류의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선박을 이용한 장기수송이나 오래 보관해야 하는 육류, 곡식류, 가공식품 등의 멸균에 활용된다.
회절
파동이 장애물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현상. 입자가 아닌 파동에서만 나타난다.
 | |
엑스선을 일정한 간격의 격자구조를 갖는 결정체(craystal)의 원자들에게 쏘이면 회절(diffraction)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이용해 금속, 세라믹 등 무기질은 물론 DNA, 단백질 등 수 많은 유기 물질들의 분자 구조를 밝혀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엑스선은 순수과학 분야나 예술 분야에 이용되기도 한다. 별의 탄생과 종말과 같은 천체 현상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관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주를 가시광선영역만으로 관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체물리학자들은 우주 관측을 위해 자외선, 적외선, 엑스선, 감마선 등을 활용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관측하고 있다.
최근의 몇 몇 사진작가들은 엑스선을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만들어 전시하기도 한다.

그림 5 엑스선, 예술작품으로 탄생하다. 사진은 정태섭 영동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촬영한 'X선 작품' . 사진 제공 : 동아일보 |
꾸준히 확대되는 엑스선 활용분야
엑스선은 인간이 찾아 낸 많은 자연현상 중 하나이자 동시에 훌륭한 발명품 중 하나다.
이것은 인류에게 크나큰 혜택을 가져다 준 눈에 보이지 않는 제 2의 빛이라고 볼 수 있다. 엑스선의 발견은 이후 자연스럽게 방사선 및 방사능의 발견으로 이어졌고, 양자역학과 핵물리학의 발전, 현대 의학의 발전에서 더 나아가 원자력에너지 기술의 진보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됐다.
엑스선은 지난 100년간 엑스선 발생장치와 엑스선 검출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 공업, 식품분야는 물론 순수 과학과 예술 분야까지, 그 사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엑스선의 활용 분야와 범위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육팁]
빛은 투과하는 성질과 반사하는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엑스선은 파장이 짧고 투과성이 높아 우리의 살은 통과하고 그 보다 밀도가 훨씬 높은 뼈와 다른 기관들은 통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엑스선의 투과성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중, 빛의 투과성과 반사성을 드러내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나눠보자.
▶ 빛의 투과성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예상 답변: 빛은 물이나 유리처럼 투명한 물체를 통과하기 때문에 유리창을 통해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다 / 빛이 몸에 쏘여도 아프지 않다 /
▶ 빛의 반사성을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예상 답변: 유리창을 통해 어두운 밖을 볼 때 얼굴이 유리에 비친다 /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 / 호수 위에 주변 풍경이 비쳐 보인다
[교육 과정]
- 초등학교 3학년 과학, 빛의 직진
- 중학교 3학년 과학, 물질의 구성 |
글 / 조규성 KAIST 원자력공학과 교수 gscho@kaist.ac.kr |
 2010-06-24
2010-06-24




















![[과학뉴스] 경비부터 커피 제조까지.. 우리 곁에 무섭게 스며들고 있는 로봇](/jnrepo/uploads/2023/05/YTN사이언스_32.jpg)
![[과학뉴스] 임신 초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복용 시 태아 저체중·기형 위험 높아.. 자세한 성분은?](/jnrepo/uploads/2023/03/YTN사이언스_11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