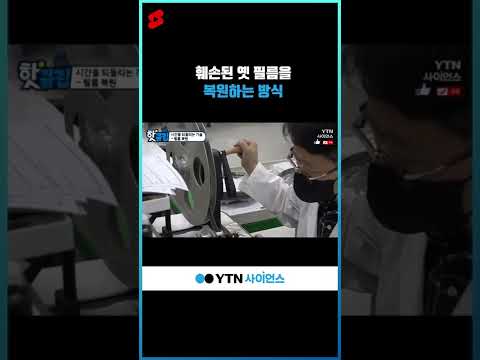빛과 기억을 저장하는 상자, 카메라의 진화
 2012-11-12
2012-11-12
예술에서 기록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한 장의 빛바랜 사진 만큼 아련한 추억을 되살리는 매개체가 있을까? 순간의 빛을 아로새기는 기계장치, 카메라는 오랫동안 일상의 기술로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과 가벼운 일탈을 기록해왔다. 그런 사진들이 있어서 우리의 개인사는 마다마디 촘촘하게 기억되고 순간순간 새롭게 구성된다. 나아가 카메라는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고발하는 저널리즘의 도구로도,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예술가의 연장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는 건전한 사회와 풍부한 문화를 만드는데도 일조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애초 빛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관측 도구로 출발한 카메라가 현재와 같은 일상의 기술로 확대되기까지 몇 번의 혁신적인 발명과 수용의 단계를 거쳐 왔다.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순간을 포착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된 동시에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유형의 인간 활동이 등장하기도 했다. 일례로 사진으로 그림을 대체하고자 초기 발명가들의 시도는 대체로 실패했지만 대신 그 특유의 사실성과 간편성으로 인해 카메라는 포토저널리즘, 아마추어예술, 일상기록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인간 활동의 도구가 되었다. 즉 사진기술은 인간활동과 기술혁신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새로운 활동과 기술을 탄생시키며 진화해왔던 것이다.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 “사실성”의 탄생

1839년에 제작된 다게레오타입 카메라와 발명자인 다게르가 1837년 그의 아틀리에를 찍은 최초의 사진작품.
ⓒ Louis Daguerre (1787-1851), ⓒ Westlicht Photography Museum, Vienna, Austria
흔히 카메라의 기원은 어두운 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바늘구멍 사진기―에서 찾지만 카메라 옵스큐라는 상을 본다는 점에서 카메라의 원리를 구현했을 뿐, 순간의 빛을 고정하는 장치는 아니었다. 빛을 기록하는 카메라가 만들기 위해서는 빛을 모으는 집광장치 뿐 아니라 상을 고정하는 감광제와 고정판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오랫동안 카메라 발명가들을 괴롭혀온 난제였다. 특히나 물질이 빛에 반응하는 시간이 곧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는 순간의 속도였으므로 질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한 카메라 개발 과정은 바로 이 감광체 개발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시간 빛과 반응하는 금속염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진 끝에 1839년 프랑스의 발명가 루이 다게르와 조셉 니에프스가 수은판에 요오드 증기를 쬐어 감광성이 있는 요오드화은을 만들고 여기에 빛을 고정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첫 번째 본격적인 카메라가 탄생했다. 이후 다게르가 몇 차례 개선을 거쳐 출시한 다게레오타입 카메라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최초의 카메라의 등장 한지 불과 10여년이 지난 1850년대, 멀리 미국에서 다게레오타입 사진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만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다게레오타입이 대중화하면서 다양한 양식의 사진들이 등장했다. 1853년 샌프란시스코 전경을 찍은 다게레오타입 사진.
ⓒ The Daguerreian Society
이렇듯 19세기 중반 카메라와 사진이 화려하게 등장하자 사람들은 곧 사진이 그림을 대체할 것이라 생각했다. 초상화를 대신한 초상사진 찍기가 크게 유행했고 자연과 사물에 대해서도 카메라가 화가의 붓보다 쉽고 정확하게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당시 사진 제작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화가의 그림 제작 과정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었던 탓에 사진은 그림을 대체하지 못했다. 다게레오타입 카메라로 당시 유행하던 초상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요오드화은이 고정되는 30여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어야 하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게다가 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오드, 수은 증기 및 각종 산성 물질들도 다루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1860년대 콜로디온을 이용한 습판 사진 기술의 개발 등에 힘입어 사진 찍는 시간을 몇 분 단위까지 크게 줄이면서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사진은 회화를 대체하기보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사진 특유의 사실성이 그림과 사진의 길을 갈라놓은 것이다.
촬영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지면서 순간포착이 사진의 무기가 되었다. 특히 기록과 보도에서 사진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장비 탓에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종횡무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돌파구를 제공한 것이 이스트만의 롤필름이다. 한번 필름을 장착해서 여러 장의 사진을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휴대용 카메라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스트만의 롤필름과 휴대용 카메라; 아마추어 사진가의 등장
조지 이스트만의 롤필름과 휴대용 카메라는 기술개발과 발상의 전환으로 탄생했다.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일찍부터 사진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스트만은 당시 카메라의 감광체가 콜로디온 습판인 탓에 무겁고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볍고 편리한 감광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해 동안 고심했다. 결국 이스트만은 3년여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젤라틴 유제를 이용한 건판(乾板)을 발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1881년 이스트만 건판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를 설립한지 몇 해 지나지 않은 1884년 이스트만은 다시 혁신을 시도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건판을 여러 장 겹친 롤필름이었다. 롤필름의 등장으로 카메라는 비로소 휴대용 기록 장치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스트만의 롤필름이 기존 유리건판에 비해 사진의 질이 좋지 않고 필름 처리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기존 사진전문가들조차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사진가들이 처리과정의 어려움과 사진의 질 저하를 감수하고라도 휴대성을 선택할리 만무했다.
위기의 순간 이스트만은 사진기술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사진 제작 과정은 감광물질을 판에 장착하고 사진을 찍는 단계, 그리고 인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었는데 이스트만은 자신들의 회사가 미리 장착된 롤필름을 통해 첫 번째 단계를 간편하게 만든 카메라를 판매하는 한편, 사용한 카메라를 수거해 복잡한 현상과정을 대신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1888년 “당신은 버튼만 눌러라,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롤필름을 장착한 코닥 카메라가 출시되었다. 이러한 단순한 카메라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을 열광시키기 충분했다. 즉 이스트만은 특유의 복잡함으로 기존 사진전문가들에게 외면 받은 사진 기술을 단순한 촬영 도구로 변모시킴으로써 아마추어 사진가라는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조지 이스트만 덕분에 일반인들도 쉽게 사진을 찍는 시대가 열렸다. ⓒ 동아일보 DB

롤필름과 펜타프리즘 카메라의 발명은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wikipedia
그러나 카메라 사용이 간편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작품’과 ‘스냅사진’의 구분은 남아 있었다. 본격적인 작품촬영에는 고도의 기술과 만만치않은 비용이 필요했던 것이다. 필름 없이 이미지를 대량 생성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또 한번 변했다.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 CCD와 이미지 파일; 이미지의 대량 생성·복제의 시대

이 자그마한 CCD 소자가 누구나 제약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혁명'을 일으켰다. ⓒ NASA
디지털 카메라의 감광체인 CCD의 발명은 1969년까지거슬러올라간다. 벨연구소의 연구원이던 월러드 보일과 조지 스미스는 빛을 전하로 변환시켜 디지털 이미지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향후 필름을 대체할 새로운 감광 소자를 발명했던 것이다.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 중계를 계기로 세간에 알려진 디지털 카메라 기술은 불과 20년 새 크게 성장해, 2002년쯤부터 필름 카메라 판매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2006년 캐논이 필름 생산을 중단한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제 카메라 기술은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카메라는 기존 필름이 놓였던 자리에 CCD가 놓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외형과 작동원리 등 사진을 찍는 과정은 필름 카메라와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제한된 장수의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를 현상소에 맡기던 과정이 사라지고, 마음 내키는 대로 찍어서 바로 확인하고 삭제와 보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사진을 찍는 행위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 사진찍기는 오랜 시간 공들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수많은 이미지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행위가 되었다.
이렇듯 다량의 사진을 제한 없이 찍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대량 생성·복제 되면서 사진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 작품과 일상사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예술과 생활이 중첩되면서 카메라는 단지 사실과 추억만을 ‘기록’하는 매체인 동시에 공감과 감동을 자아내는 ‘작품’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확보했다. 초기의 사진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예술’로 인정되기를 바랐던 꿈이 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오선실(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수료, 한양대 강사)
- 다음
- 컴퓨터 바이러스는 언제 생겨났을까? 2012.11.12
- 이전
- 인기 드라마의 필수공식 기억상실, 이것이 실제라면? 2012.11.06
댓글 남기기
전체 댓글수 0












![[핫클립]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 필름 영화 복원](/jnrepo/uploads/2022/10/핫클립-아날로그를-디지털로-필름-영화-복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