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field )
 2010-08-24
2010-08-24
유리수(有理數) 전체, 실수(實數) 전체, 복소수(複素數) 전체와 같이 사칙연산(四則演算)이 가능(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한 체계. 방정식의 대수적 해법의 연구에 수반해 하나의 대수방정식의 근(根)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정식(整式)으로 표시되는 수의 체계가 다루어지면서부터 독일의 수학자 J. W. R. 데데킨트가 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갈루아군(群)을 근의 치환으로서가 아니라 체의 자기동형(自己同型)으로서 고찰했다.
L. 크로네커는 체 K의 유한차(有限次) 대수확대체를, 다항식환 K[x]의 기약다항식 f(x)에 의해 잉여환 K[x]/f(x)K[x]의 형태로 주는 생각을 도입했다.
또한 이전부터 정수의 취급에서 볼 수 있었던 「p를 법으로 하는 합동」에 의해, p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체도 고찰의 대상이 되고, K. 헨젤의 p진수(進數)의 등장 등에 힘입어, E. 슈타이니츠가 소체(素體), 분리대수적 원소, 완전체 등의 개념의 도입을 포함, 체의 이론을 하나의 정리된 형태로 체계화했다.
그 후 무한차의 대수확대 및 초월확대 등의 이론이 더욱 정비되었다.
〔체의 정리〕 집합 K에 두 연산(보통 덧셈 · 곱셈이라 한다)이 정의되어 있다고 하자.
K의 원소 a, b에 대해 그 합 a+b, 곱 ab가 정해지며, 이 연산에 대해 다음 조건 ①~③이 만족될 때 K를 체라 한다.
(1) K는 덧셈에 대해 가환군(可換群)을 이룬다.
즉, ① a+b=b+a, ② (a+b)+c=a+(b+c), ③ 항등원 0이 존재해 a+0=a=0+a, 또는 각 원소 a에 대해 a+b=0이 되는 원소 b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b는 단 하나뿐이고 -a로 표시된다.
(2) K의 0 이외의 원소 전체 K![]() 는 곱셈에 대해 가환군을 이룬다.
는 곱셈에 대해 가환군을 이룬다.
즉, ① ab=ba, ② a(bc)=(ab)c, ③ 항등원 1이 존재해 a · 1=a이고, 각 a에 대해 ab=1이 되는 원소 b가 있다.
이 b는 a의 역원(逆元)이라하고 a![]() 로 표시된다.
로 표시된다.
(3) 덧셈과 곱셈 사이에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
(2)에서 K![]() 를 단순히 군으로 한 것을 사체(斜體)라고 하는데, 사체도 포함해 체라고 할 때가 있다.
를 단순히 군으로 한 것을 사체(斜體)라고 하는데, 사체도 포함해 체라고 할 때가 있다.
그 경우는 위에서 정의한 것을 가환체라고 한다.
사체이고 가환체가 아닌 것은 비가환체라 한다.
사원수체(四元數體)가 그 보기이다.
(1) 동형(同型) : 체 K에서 체 L로의 사상(寫像) f가 있어, f(a+b)=f(a)+f(b), f(ab) =f(a)f(b), f(K)=L 일 때 f는 K에 서 L로의 동형이라 한다.
그리고 K=L일 때 f는 K의 자기 동형이라 한다.
(2) 표수(標數) : a가 체 K의 원소이고 n이 자연수일 때, na는 a를 n회 더한 합 a+a+…+a를 나타낸다.
또 (-n)a는 -(na)로 정한다.
그러면 K의 항등원 1에 대해 m · 1=0이 되는 정수 m 전체를 취하면, ① 0뿐이거나, ② 어떤 소수(素數) p의배수 전체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①일 때 0을, ②일때 p를 K의 표수로 정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 커효과(Kerr effect) 2010.08.24
- 이전
- 콜린에스테라아제(cholinesterase) 2010.0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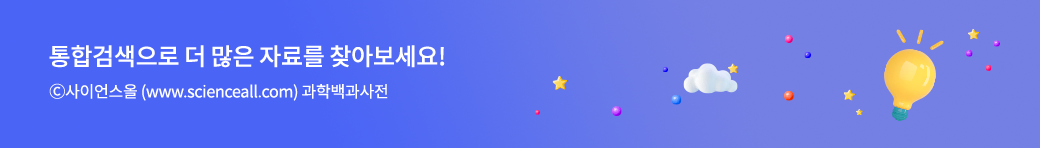
관련 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