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어(automatic control)
 2010-08-20
2010-08-20
제어장치에서 지령을 조작으로 바꾸는 기능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는 것. 수동제어(手動制御 ; manual control)에 대조되는 것으로, 현대의 기술사회를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의 하나이다.
미리 설정된 임무를 다하도록 대상에 필요한 조작을 가해, 그 상태와 거동을 의도대로 변화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제어」라 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기구(機構)를「제어계(制御系)」, 여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를「제어장치」라고 한다.
제어의 대상은 자연에서부터 사람의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제어란, 물리량(物理量)을 주대상으로 하는 공학분야의 개념으로서, 제어공학은 계측(計測) 등과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에나 공통된 횡단적(橫斷的)인 개념으로서 인식된다.
자동제어에 대한 비근한 예를 들어본다.
겨울철의 어느 날 서재를 난방하려고 가스 난로를 켰다.
추웠던 실내가 따뜻해지고, 얼마 지나 약간 덥게 느껴졌으므로 화력을 약하게 해 보았더니 이번에는 좀 춥게 느껴졌다.
이처럼 화력을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하며 적당히 조정을 하다 보면, 실내는 대략 알맞은 온도가 된다.
그런데 가스 난로로는 공기가 탁해져 두통을 느끼게 되므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그러자 밖의 찬 공기가 흘러들어와 실내가 갑자기 추워져 일시적으로 화력을 세게 했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게 된다.
이와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려면 기계에 일련의 온도조절동작을 맡겨야 하는데, 우선 춥다거나 덥다거나 하는 막연한 감각으로는 분명히 조절되지 않으므로, 온도를 정량적(定量的)으로 측정해, 이것이 조절의 목표값, 예컨대 22℃보다 높은가 낮은가를 판단, 높으면 화력을 약하게, 낮으면 세게 되도록 정정초작(訂正操作)을 끊임없이 시키게 된다.
즉, 계측 · 판단 · 조작의 3동작이 불가결해진다.
계측에는 적당한 온도 센서(감지기)를 쓰고, 판단과 조작에는 인간의 의도와 동작, 즉 인간 의 두뇌와 신경계의 역할을 기계로 대치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것을 하는 것이 이른바 제어장치인데, 논리판단에 입각한 정보처리기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기능변경에 대처하기 쉬운 컴퓨터가 안성맞춤이다.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온도라는 1변수의 제어에 그치지만, 습도, 열에너지의 손실, 공기의 혼탁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생각하고, 쾌적성(快適性)도 추구해야 한다.
이처럼 온도 · 습도 · 기체성분이라는 3변수를 제어함으로써「쾌적함」이라는 추상적인 가정량(假定量)을 제어할 수 있게 되므로 그만큼 제어계, 즉 제어방식이나 제어장치 등이 고도화 · 복잡화된다.
〔역사〕원동기의 회전속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18세기말에 만들어진 거버너(governor ; 調速機)가 자동제어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에는 통신기기의 신호전달 특성, 증폭기(增幅器)의 안정화 등의 문제로, 되먹임 이론이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20세기 중엽부터 되먹임 제어에 기초를 둔 1변수 1출력의 「고전제어이론(古典制御理論)」이 보급됨에 따라 먼저 온도 · 유량(流量) 등의 프로세스 상태를 일정값으로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제어가 공기압조절계(空氣壓調節計)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군사적인 요구에서 각종 자동추적(自動追跡 : automatic tracking) 시스템이 두드러지게 진보했다.
이들 기술은 모두 공업국의 자동화의 추진력이 되었다.
40년대말에 N. 위너가「물질」「에너지」와 비견되는 요소로서「정보」를 내세워, 이것을 제어와 합친 새로운 공통이론인 「사이버네틱스(인공두뇌학)」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제어의 개념을 공학의 범위 밖으로 확장하는 근거를 부여했으며, 「제어이론」도 60년대부터 다변수(多變數) · 다출력(多出力) 시스템을 상태공간법(狀態空間法)으로 다루는「근대제어이론」이 전개되었다.
제어가 자동화 시스템 전개의 기반이 된 배경에는 트랜지스터 등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있다.
특히 컴퓨터의 진보 · 보급은 생산설비의 자동감시 · 제어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
당초의 생산설비의 국소적(局所的)제어는 규모확대에 따라 점차 중앙집중화 및 전자화(電子化)되었으며, 이윽고 그래픽 패널로 상징되는 아날로그 계기(計器)가 확립되었고, 이와 더불어 중앙기능(中央機能)의 개선에 디지털 방식이 채택되었다.
반도체의 기술진보는 집적회로(IC)의 집적도(集積度)를 점차 향상시켜, 70년대 후반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급격히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논리회로(論理回路) 의존의 시퀀스 컨트롤러가 보다 지성화된 프로그래머블 컨트롤러로 대체되는 등 컴퓨터 제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원리〕제어장치는 제어대상에 조작지령(제어신호)을 전한다.
이에 따라 제어대상은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를 제어장치에 되돌리고, 제어대상의 목표 상태(목표값)와의 차이(偏差量)를 검출해 차이에 따라 대상의 상태를 수정하는 지령(제어신호)을 새로운 대상에 보낸다.
이 동작은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즉, 제어에서는「검출」「비교(판단)」「조작」의 3동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신호의 흐름을 보면, 한 바퀴 도는 폐회로(閉回路)가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어는 되먹임 제어라 불리는 대표적인 자동제어의 원리이다.
예컨대 모터의 속도나, 화학반응중의 원액(原液)의 온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항로를 따르기 위한 선박의 조타(操舵) 등, 전류와 유량(流量)과 타각(舵角)을 조절하도록 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매우 교묘한 방식이다.
그 적용에는 제어할 시스템의 임무에 따라 제어량을 항상 목표값의 변화에 추종시켜야 하는 경우와 제어량이 항상 일정값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를「추치제어(追値制御), 후자의 것을「정치제어(定値制御)」라 한다.
추치제어에서도, 목표값이 시간적으로 자유자재로 변화해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추종제어(追從制御)」또는「자동추적(自動追跡)」이라 하며, 특히 제어량이 변위(變位)인 자동제어계에서 추치제어를 하는 것은「서보기구(機構)」라 한다.
또한 목표값이 미리 설정된 순서를 따라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추치제어를「프로그램 제어」라 한다.
발전기나 모터, 그 밖의 원동기를 비롯해 기기(機器)의 운전에 관한 물리량(전압 · 회전속도 · 주파수 · 압력 등)을 제어량으로 하는 자동조정은 정치제어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자동평형계기(自動平衡計器) · 매니퓰레이터 · 산업용 로봇 · 프로세스용 조작부 · 이동체(인공위성 · 로켓 · 항공기 · 선박 등)의 방향이나 자세의 제어 등 서보 기구의 적용례는 매우 광범위하다.
공작기계의 본뜨기 제어는 프로그램 제어, 레이더에 의한 비행기의 추적은 자동추적으로, 이들은 추치제어를 적용한 예이다.
프로세스 공업에서는 플랜트에 투여되는 원료와 에너지의 상태를 제어해 제품을 만드는데, 이와 같은 환경과 원료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압력 · 온도 · 액체위치 · 속도 등을 제어량으로 하는 정치제어가 주류인 되먹임 제어가 채택된다.
생산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제어도 현재는 산업 시스템 · 사회 시스템에 머물지 않고, 지구규모의 자원탐사나 환경보전에 관여하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도입분야가 확대되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 이트륨화합물(yttrium compound) 2010.08.20
- 이전
- 이트륨(yttrium) 2010.0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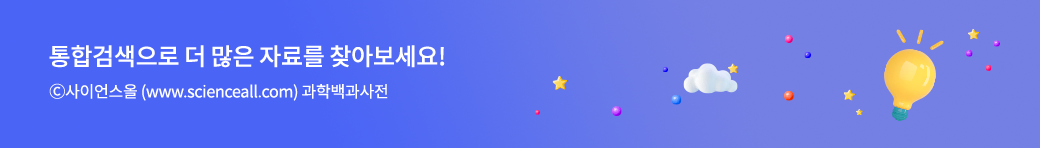












![[사이언스타임즈] 커넥티드카, 해커와의 ‘전쟁’](/jnrepo/uploads/2017/08/auto-isac-vehicle-connectivity-ne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