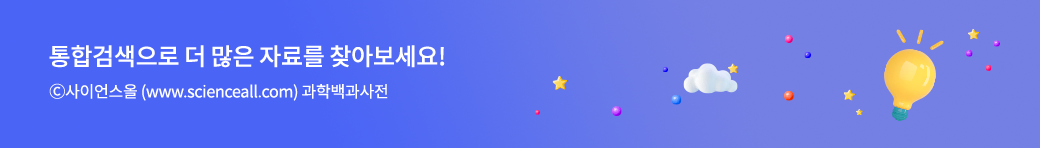양자전기역학(quantum electro dynamics)
 2010-08-20
2010-08-20
하전입자와 전자기장(電磁氣場)으로 이루어진 역학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양자역학. 전자기장과 전자의 양자론, 또는 양자전자역학이라고도 하며 QED라고 약칭한다.
양자역학이 정립된 이 후 P. A. M. 디랙은 전자기장을 무한개의 진동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전입자가 빛을 흡수·방출하는 것을 양자역학적으로 다루어 전자기장에 수반되는 입자와 광자(光子)의 생성·소멸과정을 기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입자의 역학계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기술에서는 보통 입자수가 일정하다고 상정한다.
디랙의 선구적인 연구에 뒤이어 입자에 수반되는 파(波), 즉 드브로이파의 양자화로 입자의 생성·소멸과정을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물질장(物質場)의 양자화이다.
1929년에 W.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는 상대성이론에 따른 전자장과 전자기장이 공존하는 역학계의 양자역학, 즉 상대론적 양자론의 형식을 완성했다고 생각했으나 중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것은 양자전기역학의 해(解)를 전하 e의 멱(冪)전개로 구할 때 e의 1차항이 실험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e의 2차 이상의 항에서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점이다.
이 발산은 장이 무한개의 독립된 진동자의 집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점, 즉 장의 자유도가 무한대라는 데서 비롯되므로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런데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는 무한대의 발산과 양자화된 전자기장과의 유추가 중간자장을 연구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고 중간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언했다.
또, 48년에 E. 슈뢰딩거와 도모나가 신이치로(朝永振一郞)는 양자전기역학의 해에 나타난 발산을 질량형과 하전형으로 정리하면 이 발산들을 질량 m과 하전 e에 흡수시켜서 유한처리가 가능함을 증명했다.
이와 같이 발산을 가진 질량이나 전하는 실재하는 전자가 한 개일 때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발산을 가진 질량과 전하를 실험값으로 치환하면 유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재규격화이론(re-normalization theory)이라고 한다.
다이슨은 전하 e의 멱전개를 임의의 차수로 흡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규격화이론의 초기에 이미 양자화된 전자장의 작용에 의해 생기는 전자의 자기모멘트의 차나 수소 원자 내 전자의 궤도에너지의 차, 즉 램이동(Lamb shift ; 수소원자의 2S![]() 과 2P
과 2P![]() 의 속박상태 에너지의 차)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치하고 있다<표>.
의 속박상태 에너지의 차)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일치하고 있다<표>.
이 결과는 매우 놀랄만한 일이지만 양자전기역학의 해 자체는 e의 멱급수로 수렴하지 않고 접근급수가 되므로 질량과 전하의 발산과 함께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79년에 노벨상을 받은 와인버그-살람의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의 통일장이론의 수립으로 양자전기역학은 이 통일이론에 포함되게 되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 알비레오(Albireo) 2010.08.20
- 이전
- 알비노(albino) 2010.08.20